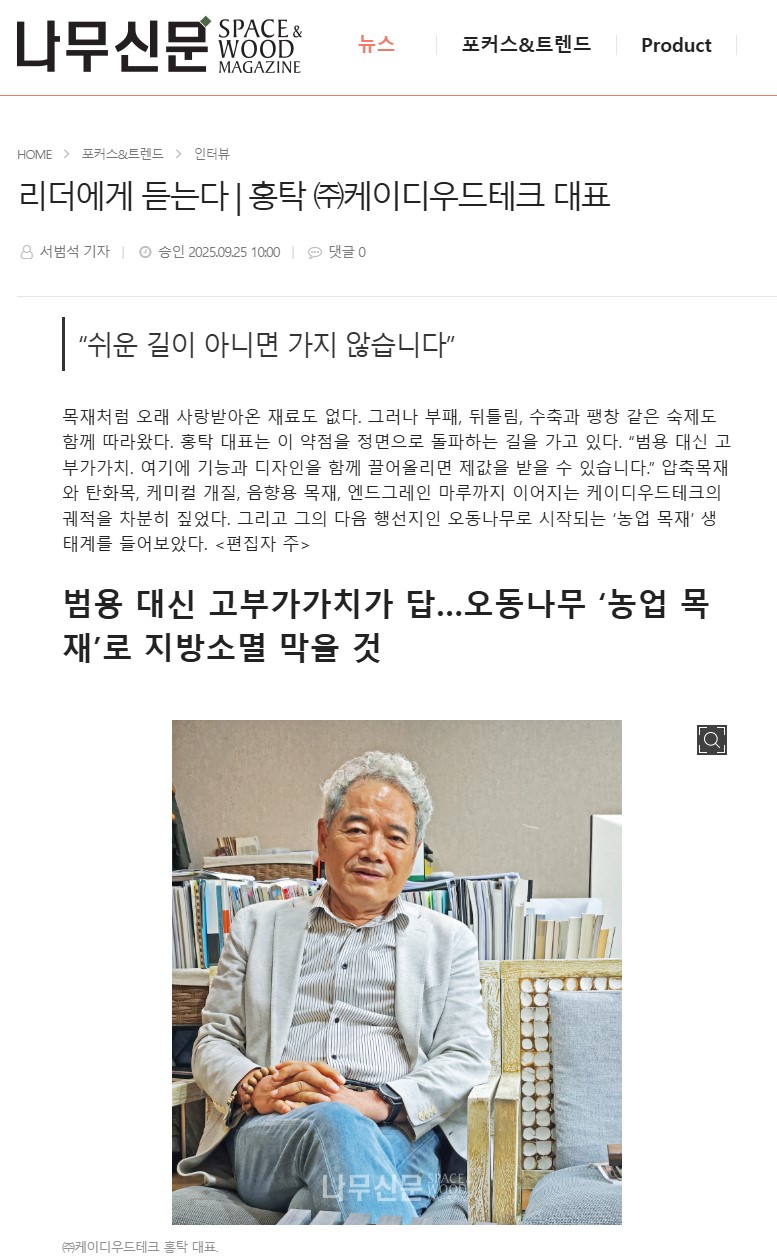“쉬운 길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목재처럼 오래 사랑받아온 재료도 없다. 그러나 부패, 뒤틀림, 수축과 팽창 같은 숙제도 함께 따라왔다. 홍탁 대표는 이 약점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길을 가고 있다. “범용 대신 고부가가치. 여기에 기능과 디자인을 함께 끌어올리면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축목재와 탄화목, 케미컬 개질, 음향용 목재, 엔드그레인 마루까지 이어지는 케이디우드테크의 궤적을 차분히 짚었다. 그리고 그의 다음 행선지인 오동나무로 시작되는 ‘농업 목재’ 생태계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범용 대신 고부가가치가 답…오동나무 ‘농업 목재’로 지방소멸 막을 것
케이디우드테크를 대표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특별한 제품’들입니다.
대표 제품 다섯 가지를 꼽아주세요.
=첫째는 압축목재입니다. 2000년대 초 간벌재 같은 소경재를 압축해 대재로 만드는 기술로 특허를 냈죠. 국내 상용화는 비용문제 때문에 좌절됐지만 중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시장을 키웠습니다.
둘째는 탄화목입니다. 160~230℃에서 장시간 가열해 목재 내부의 수산기를 안정화시키는 공정으로 흡·방습에 따른 치수 변형을 줄였습니다. 외장재 시장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내놨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케미컬 개질목재예요. 아세틸화 같은 화학적 처리로 수분 친화성을 낮춰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넷째는 음향용 목재입니다. 한국에서 이 분야만큼은 저희가 선도업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품 가짓수와 기술 수준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마지막은 엔드그레인 마루입니다. 나이테가 드러나는 단면 바닥재인데, 유럽 도입가는 평당 5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절반 수준으로 국산화했습니다.

왼쪽부터 엔드그레인 마루 eclats, Mixed squre, Mixed squre.
결국 ‘기능과 성능’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제품이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디자인이 결합될 때 비싸져도 시장이 따라옵니다. 범용 제품은 가격 경쟁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남들이 하는 건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틈새의 고급소재를 개발해 제값을 받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목재제품 개발의 기술도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주신다면요.
=소재와 가공, 디자인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CNC만 해도 국내는 아직 3축 가공이 주류지만 세계는 5축 머시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각이나 복합 곡면을 다루는 수준이죠. 특히 우리나라 건축시장도 해외 설계가 유입되면서 이에 대한 국산화를 요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장치 산업과 소재 개발에 더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주력으로 삼는 것이 오동나무 조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산림이 아니라 농업적 목재 개념이 필요합니다. 고령화로 유휴 농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오동나무는 초기에 3~6개월만 잡아주면 관리가 수월하고 속성수라서 6~8년 주기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뿌리에서 맹아가 올라오기 때문에 재조림 부담도 적습니다.
조림과 수익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모델은 단순합니다. 묘목을 공급하고 7년 후 직경 40cm 이상이면 국제 시세로 저희가 책임 수매한다는 겁니다. 1ha당 약 625그루를 심고 생존률 90%를 감안하면 1ha당 1억 원대 매출이 가능합니다. 3000ha 단위로 조림하고 그 중심에 공장을 세우면 물류까지 최적화됨으로써 수익류은 더 올라갑니다.
오동나무에 대한 수요는 충분합니까.
=당장 관재만 해도 연간 35만~50만 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중국산 오동나무를 쓰고 있죠. 여기에 가구 서랍재, 악기, 경량 합판, 자동차와 선박 내장재 등 경량·가공성이 중요한 용도가 많습니다. 목재뿐 아니라 부가수익도 있습니다. 오동나무는 3년 차부터 개화가 시작되는데, 1ha당 약 700kg의 꿀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 및 조경과 결합하면 소득원이 다층화됩니다. 오동나무 조림만 잘 이용하면 지방소멸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메이트 어쿠스틱 보드패널 블랙컬러.
대표님은 오동나무 조림을 ‘산림’이 아니라 ‘농업’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뭔가요.
=현행 임업 직불 체계로는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유럽처럼 ‘농업 목재’로 보고 농업 직불을 적용해야 합니다. 농경지에서 자라는 오동나무는 농산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됩니다. 산에서 자라는 산양삼과 밭에서 자라는 인삼을 참고하면 개념이 쉬워집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자체는 조림-관광-밀원을 묶은 복합 모델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앙정부는 유휴 농지 전환과 책임 수매 연계 같은 제도적 틀을 열어주면 됩니다. 문제는 관성입니다. 산림 예산 2조8000억 중 2조 원이 여전히 숲가꾸기와 전통적 조림에 쓰입니다. 기득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시도가 막힙니다.
‘남들이 안 하는 길’을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간단합니다.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합판 한 장에 500원 1000원을 두고 싸우는 대신 저희는 고부가가치 소재를 개발해 제값을 받습니다. 엔드그레인 마루처럼 평당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품, 음향재처럼 전문화된 솔루션이 그 예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길을 가는 게 결과적으로 더 편한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재의 본질적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고 디자인으로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나무신문
출처 : 나무신문(http://www.imwood.co.kr)
http://www.imw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19















 Home
Home